『우리는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임경섭 시집 / 창비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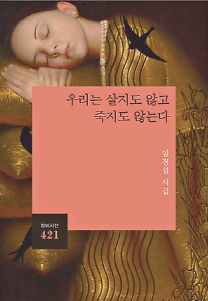
“엄마가 담근 김치의 맛이 기억나지 않는 것에 대해/ 형이 슬퍼한 밤이었다//…//모두가 돌아오는 곳에서/ 모두가 돌아오진 않았다”(처음의 맛 중)
역설(Irony)의 변주에서, 세계란 시간, 공간, 인물의 일도씩의 낮은 온도로 서로 조우한다. 어긋남의 괴기스러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공간마저, 분절하고 낯설게 만들었다. 이것은, 임경섭 시인의 시집인『우리는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에 대한 감상평이다.
임경섭 시인은 1981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2008년 중앙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첫 시집으로『죄책감』이 냈고, 지난해 6월 두 번째 시집 『우리는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를 출간했다.
수록된 140편의 시는 낱개가 아닌 흡사 장편 소설처럼 긴 서사로 독자를 이끈다. 나카타, 쇼코, 슈프링크 등의 낯선 외국어 이름들이 한 발짝 시어의 행간을 건널 때마다 서사적 사건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애달픔, 그리움, 사랑, 연민’ 등의 가치로 환원된다.
한 행이 잘려나갈 때마다 시인이 발명한 이름들은 우리가 무관하게 여겼던 일정한 상실감을 끄집어낸다. 가령,「빛으로 오다」의 시를 보면, 과학시간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빛으로 존재한다는 학습적 지식을 습득한다. 지식은 바로 내 앞에 보이는 ‘엄마’라는 존재에 비유된다. 엄마가 사라지는 것은 빛이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 화자는 두려움에 덜덜 떨며 이윽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한다. “그래도 불은 꺼야 하겠죠?/ 이제야 알겠어요 밤이 왜 존재하는지/ 밤이 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죠/우리가 사라져야 그동안 또 다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테니까 그리고 또다시 아침이 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빛으로/ 서로 다른 빛으로 태어나겠죠.”
송종원 문학평론가는 시인은 순간순간 점멸하는 메마른 현실을 날카롭게 드러낸다고 해설했다.
‘나’로부터 시작해 결국에는 ‘나’에서 파국 되는 세계의 관계망에서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을 임경섭의 시편은 고민한다.
함께하지만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시간, 그것은 시집의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껏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괴이한 정신 상태로 먼지처럼 부유했던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