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저/ 민음사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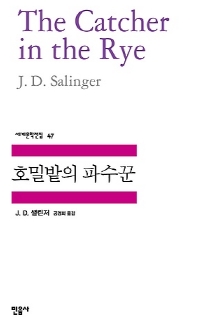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친 미국사회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이단아의 방황이나, 기성세대와의 대립, 엄숙한 퀘이커교도적 분위기를 넘어서는 종교적 도발 등 당시의 금단의 구역을 넘나드는 작품 등이 활발하게 책으로 혹은 영화로 대중들을 만났다.
영화로 따진다면 엘리아 카잔 감독의「에덴의 동쪽」이 있고, 소설로 따진다면 아마도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가 쓴「호밀밭의 파수꾼」이 있다.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하고, 거친 이단아로의 삶의 모습을 제임스 딘이 호연이라는 역으로 영화에서 보여줬다면,「호밀밭의 파수꾼」에서는 제임스 딘 못지않은 홀든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세계를 조망하며 독자를 만난다.
이 소설이 재미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주요섭의「사랑방손님과 어머니」처럼 서술자 옥희가 신뢰받을 수 없는 서술자로 나와 어른들의 세계를 조망하듯, 홀든 역시 처음부터 그만의 가치로 세계와 조우하기 때문이다.
2010년 사망 때까지 은둔자적 생활을 영위했던 저자에게 자신의 소설「호밀밭의 파수꾼」은 어떤 의미였을까. 당시 50년대 샐린저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랑받았던 작가. 하지만 그의 생이 어땠는지 독자는 쉽게 유추할 수 없다. 자신의 전기마저 법원에 금지 신청을 내고, 자신의 작품을 왜곡한 영화에 환멸을 느꼈을 그의 생에서, 그가 꿈꾸는 진실은 어쩌면 홀든의 입을 통해 숨 쉬는 말이 아니었을까.
「호밀밭의 파수꾼」이 여러 영화, 혹은 드라마의 소재가 됐고, 현재 각색되고 있다. 그만큼 세기를 뛰어넘어 이 소설이 주는 중언의 메시지는 크다.
1957년 매카시즘이 사회 전반에 걸쳐 횡횡할 때, 엘리아 카잔은 미 의회에 불려가 영화계 좌파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었고, 반대로 샐린저의 이 소설은 당시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손에 끼고 살 정도로 강한 마력을 선사했다. 그 폭발적 인기 속에 자신을 소설 속 주인공 홀든 콜필드와 동일시 하려는 ‘샐린저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던 반세기 전 소설이 다시 읽히고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허위와 기만이라는 가뭄에 해갈이 되길 원하는 대중적 꿈이 모여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김성훈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