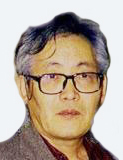
흔히 고대문화재가 발굴되면 도시에 건물 짓고 관람시키는 것이 관행이다. 발굴된 유물 현지에 박물관을 지은 발상은 남도문화를 답사하려는 여행객들에게 상찬 받을 만하다.
신라 경주의 고분군은 이미 고고학적 발굴 탐사를 끝내고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반면 영산강 유역 반남 고분군의 주인공은 누구이고 어느 왕국에 속하는가. 일제강점기 때 고고학 발굴은 진행됐어도 역사적 문헌 제시가 없었기에 한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당연히 수수께끼는 여러 주장과 억측의 상상력을 제공한다.
인류의 삶이 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세계사의 공통적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영산강유역도 동서 교통의 요지로 발달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영산강 유역은 고대의 많은 유물을 남겼다.
그러나 영산강 유역의 고대 고분군들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한국 사학계에선 이를 명쾌히 제시하지 않는 반면 일본 소장학자들은 객관적 접근을 시도한다.「고대 한일관계사의 이해- 倭 편역 김기섭 이론과 실천사」라는 책이 이를 보여준다. 이 책은 15명의 연구 논문을 편집한 것인데 흔히 왜가 한반도 내륙에 존재한 국가라고 상세히 적고 있다.
백제가 한강과 금강에 기반한 국가라면 50개의 연맹체로 구성된 마한은 전북과 전남의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삼았다.
영산강 유역의 반남 고분의 주인공은 5세기 최전성기를 구가하다 6세기 초에 백제에 복속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영산강 유역의 마한은 장고형 고분 및 부장품 등에 의해 백제와 별개 왕국이었다는 사실이 고고학적 물증으로 밝혀진다.
여기에 서기 280년 중국 서진의 역사학자 진수는 왜는 마한의 남쪽 국경과 접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왜의 소재는 지금의 전남, 영산강 유역인 셈이다. 참으로 남도인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다.
3세기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들고 영암 다대포항을 출발해 한자를 보급한 사실은 당시 백제어와 왜어가 공용이었다는 사실을 연구가들이 밝히고 있으며 후일 일본어가 뒤늦게 발명된다는 사실에서 더욱 입증된다.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하로 위협을 받은 영산강 유역의 고분 주인공들은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일본으로 이주해 지배세력이 되고 장고형 고분과 동일한 형태의 전방후원분을 인덕천 왕릉에 조성하게 된다. 어떤 재일교포 역사가는 일본의 전방후원분이 한반도로 들어와 반남의 고분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편다. 문화의 역류현상은 납득하기 힘들다. 일제강점기 시기 발굴조사에서 영산강 유역의 고분이 일본의 후장제도와 같다는 발표이후 더 이상 발굴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나일본부 식민지설만 요란하게 떠든다.
또 다른 이론은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료에 근거해 왜가 신라를 무수히 침략하고 인질 외교까지 벌인 사실에 근거해 당시 왜의 소재는 낙동강 하류에 정착해 나라를 세운 가야국이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가야공주가 일본을 세웠다는 설화설도 있다. 과연 왜가 낙동강유역의 좁은 영토 안에 세워진 국가이고 고고학적 유물이 이를 입증하는가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다. 고대사의 미해결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공백기를 재촉한 것은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 백제를 멸망시킨 것과도 인연이 있다. 영산강유역이 신라에 귀속되고 백제 유민이 농노로 전락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더욱 김부식은 백제 강토를 한반도에 한정시킨 잘못도 없지 않아 최근 학계는 이의 비판이 활발하다.
해안을 낀 영산강유역은 물산이 풍부한 곳이다. 자연적으로 경제적 토대가 막강해 중앙정부는 이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온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자본과 노동력을 집중하기 위해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동시키기 위해 바다와 소통하는 영산강을 막아 농업용수로 만든다고 호수를 만들고 영암, 해남의 해안 연안을 전부 돌려막아 해산물을 고갈시키고 곡물 경제로 바꾼 반환경적 경제 전략이 호남인의 자급자족적 환경을 파괴하고 도시 의존적 경제로 바뀌게 했다.
나주 박물관관람에서 역사를 배운다면 죽어버린 영산강 생태를 복원시켜 달라고 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