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신재생에너지 유럽연수
박상정 군의원에게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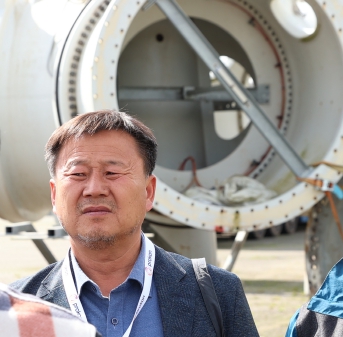
해남군의회가 해남미래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배우기 위해 유럽 연수를 단행했다. 해남군의회 박상정 의원을 만나 덴마크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들어보고 해남군 실정과 비교해보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앞서 덴마크의 경우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80%에 이르고 전적으로 풍력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일은 전력의 41.6%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고 있다.
Q. 유럽 신재생에너지 첫 인상은?
A.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산단을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지형적 차이였고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를 대하는 주민들의 자세였다.
산보다는 언덕이나 평야가 많은 유럽의 경우 풍력에너지와 태양광을 설치하기 좋은 지형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와 타인을 이해하는 관용 정신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당장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노력하고 또 실천하는 과정이 놀라웠다.
Q. 유럽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거부감이 없나?
A. 전혀 없다. 그들은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정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에너지를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 레펠드(Rehfeld) 마을의 레펠트 자가에너지조합(Rehfeld-Eigen Energie eG)은 수익 정산이 4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데 대부분 이익금에는 관심이 없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공급한다는,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또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보내는 선로 연결, 영업·판매, 여기에 유지보수까지 모든 과정이 개별 협동조합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으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합들이 융합돼 있었다.
Q. 신재생에너지를 협동조합에서 생산할 때 장점은 무엇인가?
A. 우선 한국은 한전이 모든 에너지 수급을 총괄하고 있고 태양광사업자가 생산자를 모집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즉 주민주도형이 아닌 국가 정책 또는 이익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약하고 또 거부감이 크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19세기부터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했기에 협동조합 체제가 상당히 발달돼 있고 또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있었다.
심지어 수력발전소까지 생산하는 협동조합도 있다. 이들에게 있어 협동조합은 주민들의 가치실현 참여의 통로였다. 국가 정책에 앞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다.
Q. 유럽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해남군에 접목 가능한 부분은?
A.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기업 참여 없이 주민참여로만 얼마든지 전기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배웠고 해남에서도 주민들의 주가 된 협동조합 방식의 전기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남군민 대부분은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농지를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농지와 신재생에너지가 함께 공존할 임대 토지를 전략적으로 만들어 내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공생 가능하리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