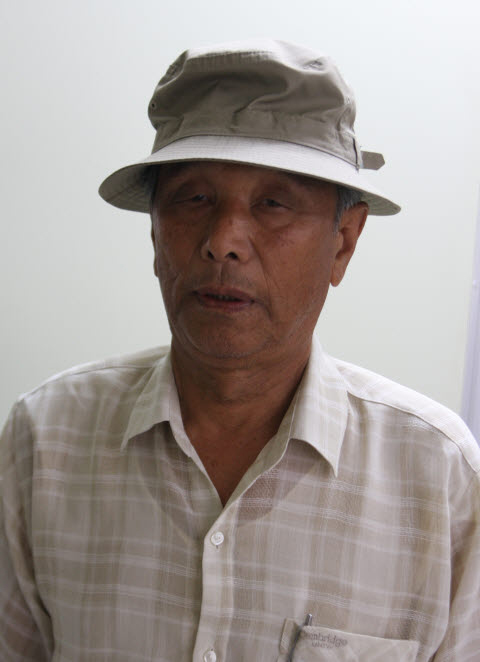 |
선비란 한자는 없고 우리말 선비란 말은 본디 북방민족국 현재 몽골어의 선, 즉 어질다 덕망이 있다와 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의 결합으로 생긴 말이라 한다.
그래서 선비란 어질고 덕망있는 지식인이라는 뜻이 된다.
한편 선비란 현대 서양의 인텔리겐차와 비교되며 영어 성(聖)saint와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
현재 우리 한국의 사회는 너무 혼탁해 총체적인 불신풍조가 팽배해 불(不)자 투성으로 불신, 불안, 불평, 불화, 불통, 불의로 흘러가고 있다.
몇 년 전 모 지방 신문에 마지막 선비란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과연 현재 사회에 참 선비가 존재하는가?, 참다운 선비가 갖춰야 할 요건은 네 가지다.
첫째, 풍부한 학식, 둘째, 모든 사물에 대한 비판 정신, 셋째, 지조 있는 처신, 넷째, 여유있는 삶(경제생활)등을 거론하고 있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의 선비의 평은 관직과 물욕을 탐내지 않는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여기 마지막 요건인 여유있는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 역대 수많은 선비 가운데 고려 말의 정몽주, 조선시대 이황, 이이, 조광조, 송시열 등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선비들이 이 세상에 왔다갔다.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모범적인 교훈을 주고 간 선비중의 선비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들고 싶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실학사상가로서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중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500여권의 책을 저술했고 과학적으로는 수원성의 축조 때 기중기를 발명한 실학자였다.
또한 자기가 지켜야 할 생활철학을 확립하였으며 많은 생활덕목을 세상에 발표했다.
18년간의 강진유배생활을 끝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땅에서 태어나 땅을 배반해서는 아니 되고 조그마한 땅이라고 놀리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 하면서 경작하였다고 한다.
선비의 덕목을 벼슬과 재물을 탐내지 않고 풍부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모름지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풍부한 생활에 기준을 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주경야독이라 낮이면 논밭을 갈아 먹는 양식을 해결하고 밤이면 책을 읽어 학문을 닦아 사회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처신을 해야 참다운 선비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해남우리신문
wonmok76@hanmail.net

